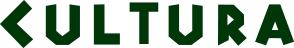영화잡지는 당대를 살았던 대중들의 취향과 영화의 흐름을 반영한다. 아울러 그 시대의 미적 감각과 유행, 배우의 인기 판도, 인쇄 수준은 물론, 언어 관습, 표현의 경향까지 엿보게 한다. 초창기의 잡지를 보면 ‘활동배우(영화배우)’, 또는 ‘애활가(영화팬)’, ‘활계(영화계)’, ‘연속사진(연속활동사진)’ 등 생소한 언어들이 자주 나오고, 희극배우 채플린을 ‘잡후린雜侯麟’이라 적고 존칭까지 붙이는 등 익숙지 못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동안 발간된 영화잡지는 《씨네21》 등 주간지를 제외하고도 모두 50여 종에 이른다. 이는 1920년대 전후부터 2000년대까지 반세기에 해당하는 기간의 수치이다. 이를 분류하면, 17종 내외가 해방 전에, 33여종이 해방 후에 나왔다. 이 가운데는 창간호가 종간호가 된 경우도 있다.
최초의 영화지 《녹성》 이후의 현황
우리나라에 영화잡지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19년 11월 5일자로 창간된 《녹성綠星》이다. 기미년 3월 1일 일제에 대한 33인의 독립선언 사건이 일어나던 해, 한국영화의 기점으로 삼는 신극좌의 활동사진연쇄극 <의리적구토義理的仇討>가 단성사에서 상연(10월 27일)된 지 열흘이 채 안 되는 시점이다. 《녹성》(A5판, 90면)은 표지에 예술잡지라고 했으나 영화 스토리 중심으로 꾸며진 영화잡지다. 1896년11월 30일 독립협회가 창간한 조선 최초의 잡지 《대조션독립협회회보》(A5판 22면)가 나온 지 23년 만의 일이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태생의 여배우 리타죠리베Mlle Rita Jolivet의 상반신 사진을 표지로 내세운 이 잡지는 「고송孤松의 가歌」를 비롯한 「독류毒流(원명구두)」, 「장한가長恨歌」, 「아루다쓰」, 「고도孤島의 보물」등 여섯 편의 영화를 애련비화哀憐悲話, 또는 사회비극, 연애비극, 대복수대활극, 인정활극이라는 다양한 분류 아래 소설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당시 연속사진 <명금名金>으로 유명한 활극계의 스타 「로로의 이야기」며, 「세계 제일의 희극배우 잡후린雜候麟 선생의 혼인」 등 스타 스토리 유의 글과 프랑스 여배우 빠르 화이트의 촬영일화(「모험활극 박히든 이야기」) 등이 고루 게재되어 있다. 이밖에 평소 영화를 즐긴 윌슨 미국 대통령이 프랑스 베르사이유 강화조약에 참석하러가는 선상에서도 <로미오와 줄리엣>, <저주의 공포> 등 10여 편이 넘는 영화를 봤다는 박스용 기사 「윌슨 대통령과 활동사진」도 실려 있다.
특이한 것은 독자들에게 100원의 현상금을 걸고 범인을 찾는 연재 탐정소설 「의문의 사死」를 쓴 복면귀覆面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차나 본문에 모두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잡지의 편집 및 발행자는 이일해이며, 발행소는 일본(동경 신전구 원락정東京 神田區 猿樂町), 발매소는 서울(경성 죽첨정, 지금의 충정로 1가 39번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기록에는 《녹성》이 방정환이 발행한 영화잡지로 되어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녹성》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영화잡지는 1926년 7월에 선보인 《영화》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5년 영화 <쌍옥루>를 감독 데뷔하고 그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복혜숙 주연의 <낙화유수>(1927)가 나오기 전해이다. 그 뒤 1927년 2월 홍개명과 이자성이 공동으로 《키네마》라는 잡지를 창간했으나, 《영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홍개명은 1년 뒤 나운규 프로덕션이 제작한 <사나이>(1928)의 메가폰을 잡으면서 영화계로 진출했다.
이례적으로 표지 제호 위에 크게 ‘고문·이경손’을 내세우며 1928년 3월 10일자로 창간된 《문예·영화》(5·7판, 54면, 정가 25전)는 나운규의 「나의 노서아 방랑기」와 김용국의 「그날의 나운규군」, 그리고 안톤 체홉의 원작을 각색한 김상진의 「그날의 주검」 등이 눈길을 끈다. 특히「나의 노서아 방랑기」와 「그날의 나운규군」은 나운규의 러시아 용병시절의 비애와 데뷔 전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발행인은 경성 서대문의 최호동崔湖東이나 발행소는 평양부 관후리 134번지로 되어 있다.
영화소설 「아리랑」으로 잘 알려진 문일文一이 발행한 《대중영화》(A5판, 정가 10전)는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처음 나온 월간잡지이다. 3월 창간호를 내놓고 한 달을 걸러 5월호를 발간했으나 뒤를 잇지 못했다. 이후 휴간상태였던 것을 영화제작에 뜻을 둔 김광수金光秀 등이 공동으로 판권을 인수하여 창간 1주년이 되는 1931년 4월호부터 속간한다(매일신보, 1931.2. 17.)고 했으나, 실제로 발간되었는지는 확인할 수없다.
《영화시대》(A5판, 78면 내외, 정가 10전)가 등장한 것은 1931년 4월1일이다. 조용균과 함께 공동 발행인인 박누월朴淚月은 뒷날 권말부록 「조선영화발달사」로 더 알려진 『영화배우술』(1939, 삼중당 발행)의 저자이기도 하다. 창간 후 사용하던 서울 수은동 단성사 2층 사무실은 경영난으로 휴간하면서 비우고, 34년 11월 김현수金賢秀에게 넘어 간 뒤 38년까지 띄엄띄엄 명맥을 잇게 된다. 해방 후 박누월이 다시 경영을 맡아 1946년에 복간호를 내놓았으나 지속하지 못했다. 박누월은 1950년대에 객사하였다.
1946년 4월 속간 제1호(무정기판) 목차를 보면, 이병일의 「전향기 조선영화의 진로」, 강소천의 「조선영화가 걸어온 길」, 이창용, 이규환, 이필우, 김소영 등 9인에 대한 「조선영화인약전·촌평」 안종화의 연재 시나리오 「백두산」등 주목할 만한 글들이 실려 있다.
단성사 선전부에서 《영화가映畵街》를 내놓은 것은 그로부터 2개월 뒤인 6월 20일이다. 자사 극장의 개봉영화를 홍보할 목적으로 만든 간행물이다.
김인규와 문일 등의 발기로 1932년 5월 1일 창간된 《신흥예술》(5·7판, 70면, 정가 15전)은 제호와는 달리 90%가 영화 관련 글들로 채워진 사실상의 영화잡지이다. 윤백남의 「조선영화사적 일화」, 박기채의 「소비에트영화의 5개년 계획」, 문일의 「독일영화의 각색법」나웅의 시나리오 「환멸」 등이 그 예이다. 그 외에 김유영, 서광제, 이효석, 김영팔 등 프롤레타리아예술가동맹 진영의 인사들이 필진으로 참여하였다. 《신흥영화》(5·7판, 60면, 발행인 마춘서)는 그로부터 꼭 한 달만에 출간되었다. 6월 창간호를 보면, 김효성의 「싸베트의 토키 이론」, 나태영의 「영화와 표현」, 사중인의 영화강좌 「영화극배우술」, 나웅의 소형영화 시나리오 「고향」 등이 눈에 띈다. 이 밖에 현철의 「조선신극계의 회고와 전망」, 유치진의 「연극의 대중성」과 길명순의 소설 「신여성」 등이 수록되어 있다.
《영화부대》는 이론적 전문지의 성격을 띠고 창간(1934년 7월 1일)되었다. 평론, 외국영화소개 외에 수필, 가십도 곁들였다.
1936년 가을로 접어들면서 제호가 유사한 두 개의 영화잡지가 등장하여 독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바로 신량辛樑이 9월1일에 창간한 《영화조선》과 백명곤白命坤이 10월1일자로 낸 《조선영화》가 그것이다.
《영화조선》(A5판, 정가 25전)은 홍효민(근대문명과 영화예술), 민명휘(영화감독 박기채론), 이규환(영화강좌/한 개의 영화로 나오기까지), 김인규(나운규 군이 걸어온 길) 등을 필진으로 동원하고, 안종화, 김유영, 서광제,문예봉, 등 14명이 참석한 영화인 좌담회를 읽을거리로 내놓았다. 《조선영화》(5·7판, 정가 20전)는 「조선영화 고심담」과 「첨단여성영화 좌담회」, 「조선영화 제작에 대한제씨의 건의」(송영 외 3인), 「조선영화기업론」(최장) 등으로 이에 맞섰다. 특히 <아리랑>의 나운규를 비롯한 심훈(먼동이 틀 때), 안종화(청춘의 십자로), 이규환(무지개), 이명우(춘향전) 등이 영화를 만들 때의 고충과 뒷이야기가 담긴 「조선영화 고심담」은 흥미와 함께 사료적 가치가 높다.
1939년 11월 1일자로 서울 종로 6가에서 창간된 《영화연극》(A5판, 132면, 정가 30전)은 최익연崔翼然이 편집 겸 발행인으로 되어 있다. 목차는 3면으로 짜였는데 그 내용이 매우 다채롭다. 윤봉춘의 「나운규 일대기」를 비롯하여 남수월의 「조선영화감독론」, 이금룡, 김신재 등 10여 명이 등장하는 상호인물평 「내가 본너, 네가 본 나」 등이 실려 있다. 그런데 다음 해 1월 20일자에 나온 제2집(표지화 이주홍)에는 일제강점 말기의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여러 모습들이 나타난다. 그라비어판 사진화보의 첫 장을 장식한 「황군에게 올리는 감사문」 외에 「내선일체의 정신을 앙양하라」는 제목의 권두언, 친일영화 「‘지원병’ 로케이션기」 등이 바로 그런 예이다.
해방 후 나온 20여 종의 잡지
해방 후에는 영화제작자 이철혁이 발행한 《예술영화》(4·6배판, 36면, 정가 100원)로 영화잡지 간행을 유도한다. 그는 이규환 감독의 <갈매기>(원명 해연)를 제작한 예술영화사(대표 김낙제) 소속 제작부장으로 회사의 도움 아래 1948년 5월 5일 첫 호를 내놓았다. 표지부터 <갈매기>의 주연인 김동규의 상반신 스케치를 내세워 ‘해연海燕 특집’으로 꾸몄다. 이운룡의 「영화 ‘해연’ 탈고기」, 이규환의 「‘해연’ 연출 전기」, 김동규의 「‘해연’에 출연하면서」 등 홍보효과를 노린 것과 함께 양세웅의 「아메리카영화의 촬영기술」, 이청기의 「영화와 현실」, 허용의 「전후의 소련영화」 등을 게재하여 영화지로서의 구색을 맞추려 했다.
1952년 12월에 이르러 본격적인 월간 영화대중지 《영화세계》(4·6배판)가 강대진姜大榛에 의해 창간되고 잇따라 55년 국제영화뉴스사의 박봉희朴鳳熙 사장이 《국제영화》(4·6배판, 정가 300원)를 내놓아 영화잡지 경쟁 시대로 진입한다. 두 잡지 모두 영화계의 가십 거리나 국내외 스타 스토리, 제작, 수입영화를 소개하면서도 《국제영화》(1958년 5-6월 합병호, 132면)의 예에서 보듯이 외부 필진에 의해 「특집/영화제작에의 새로운 방향」이나 「‘돈’ 출품 시비와 금후의 문제」와 같은 당면 문제를 놓지 않고 다루기도 했다.

《씨네 팬》 1662년 6월호, 《실버스크린》 1964년 창간호, 《영화예술》 1965년 5월호(2호)
《현대영화》(1955년 9월호 창간)는 《국제영화》와 비슷한 시기에 나왔다. 체재나 내용면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이 두 잡지만큼 수명이 길지 못했다.
《시나리오문예》(A5판, 154면, 정가 300환)는 1959년 9월 하동렬(극작가 하유상의 본명)에 의해 창간된 시나리오 중심의 격월간 영화잡지이다. 「4291년도 시나리오계 개항」으로 시작된 제1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역작 특집으로 묶은 「인생차압」(오영진 각본), 「자유결혼」(하유상작 김지헌 각본) 「오, 내 고향」(김소동, 최금동 각본), 「별아 내 가슴에」(박계주 작, 이봉래 각본) 등 네 편과 최창봉의 「시나리오와 TV의 기법적 차이」, 김묵의 「‘나는 고발한다’를 감독하고나서」 등이다. 이 잡지는 61년까지 발행인이 바뀌며 8집까지 나왔다.
* 기사 전문은 추후 공개됩니다. *

김종원 1937년 제주시 출생. 1957년-59년 《문학예술》 및 《사상계》 시 추천 등단. 1959년 《시나리오문예》를 통해 영화평론 활동 시작. 1960년 이영일 등과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발족. 시집 『강냉이 사설』 『광화문행』 『시네마 천국』이 있으며, 저서로 『영상시대의 우화』 『스크린 인생론』 『우리영화100년』 『한국영화사와 비평의 접점』 등이 있음. 청룡영화상 제1회 정영일영화평론상 수상. 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 제2대와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제3대 회장, 청주대, 동국대 대학원, 한예종 겸임교수 역임. 2011년-현재 한국영화평론가협회 상임고문.
* 《쿨투라》 2025년 4월호(통권 13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