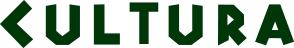동료문인 선정, 작년 최고의 시는 나희덕 시인의 「종이감옥」
최고의 시집은 송찬호 시인의『분홍 나막신』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기억에 남았던 좋은 시와 시집을 모아 열여섯 번째 『2017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시』(이하『2017 오늘의 시』)를 내놓는다.
서정시는 확실히 근대의 ‘저편’을 응시하고 꿈꾸는 상상적 양식임에 틀림없다. 물론 시인들은 가파르기만 한 현실을 확연히 대체하는 ‘다른 현실’이 아니라, 근대 너머의 꿈으로 가 닿는 대안(對岸)이 ‘시적 현실’이라고 믿는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식민지 세대, 전쟁 세대, 4·19세대, 유신 세대, 386세대, X세대, IMF세대, 스마트폰 세대 등 다양한 시간적 단층들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고 있다. 모두 시간의 단층으로 구별되는 가설적 구획일 뿐이다. 하지만 경험적 세대론이 전혀 무망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저마다의 고유한 경험과 기억이 자신만의 개성으로 살아 움직이는 ‘시간예술’로서의 시를 써가는 것일 테니 말이다. 이제 우리는 아직도 팽팽한 언어로 ‘시적 현실’을 구현해 가는 이들의 기억과 감각을 따라가면서 열린 마음으로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2017년『오늘의 시』는, 이러한 ‘시적 현실’을 보여주는 기능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한다. 그러한 바람을 바탕으로 하여 이 책은, 우리 시단의 다양한 풍경을 깊이 사유할 수 있는 유력한 미적 근거들을 갖춘 수많은 가편들을 수록하였다. 많은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은 시편과 시집은, 미적 완결성과 개성적 목소리를 아울러 견지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성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발표되었던 시편 가운데 나희덕 시인의「종이 감옥」이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다. 그의 시편은 시인에 대한 시라고 할 수 있다. 시인을 몰라도 그의 실루엣이 보이는 시편, 보편적으로 시인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몰라도 짐작하게 하는 시편이 아닐 수 없다. 일차적으로는 시인의 일과와 고뇌와 공간을 볼 수 있고, 더 자세히 보면 오래된 책 냄새와 책장 사이의 먼지 냄새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원고지, 책, 문자, 언어 속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문학하는 이의 숙명이자 본질일 텐데 그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 시에서 만날 수 있다.
시집으로는 송찬호 시인의『분홍 나막신』(문학과지성사)이 선정되었다. 이번 시집에는 한 인간이 핏줄처럼 애착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 있다. 내면의 핏방울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시집 제목 역시 ‘분홍’이 되었다. 또한 이 시집의 특징은 환상성인데, 환상성은 특히나 사랑에 관련된 작품들에 자주 등장한다.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의 속삭임이 들리는데 그것이 다 환상이었다니 잃은 상실감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 특히나 이 시집에 고루 실려 있는 시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시들을 읽으면 환상성 아래 감추어진, 문학 자체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느낄 수 있다.
좋은 시를 선정하기 위해 『2017 오늘의 시』는 100명의 시인, 문학평론가, 출판편집인을 추천위원으로 추대, 좋은 시 80편(시조 20편 포함)을 선정, 수록하였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발표된 시집 가운데 ‘좋은 시집’으로 평가되는 18권의 시집(시조집 4권 포함)들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기획위원들의 「2017년 한국 시의 지형과 지향」이란 주제의 좌담은 최근 시의 지형과 지향을 살피며, 오늘의 시에 대한 전망과 기대를 시의 행간으로 읽고 있다. 또한 말미에 붙인 나희덕 시인 인터뷰(나민애)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나희덕 시인의 그동안의 시적 성취와 시세계를 엿볼 수 있는 귀한 지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시단은 시에 대한 믿음으로 2017년 이후의 풍경을 꿈꾸게 될 것이다. 지난 한 해의 시적 성과들은, 이러한 시적 과제에 확연하고도 분명한 미학적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탄탄한 미적 완결성을 두루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쪼록 이 책이 우리 시대의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유추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2017 ‘작가’가 선정한 오늘의 시』 목차
■펴내면서
2 0 1 7 오 늘 의 시
강형철 「자본주의」_14
고두현 「공룡 발자국」_16
고영민 「무화과」_17
고진하 「당신 발을 씻기며」_18
공광규 「율곡사」_20
곽효환 「해질 무렵」_22
김경주 「슬픔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을 할까?」_24
김기택 「야생」_26
김명인 「어부의 세계」_28
김보람 「내부 기지국」_30
김선태 「얼굴」_31
김성춘 「冊」_33
김영란 「마른 꽃」_35
김영찬 「불쑥 솟아오르는 still-life, 정물화」_36
김용택 「그런 날」_38
김이하 「흐린 하늘이 더부룩하여」_39
김일태 「눈독, 저 장미」_41
김종태 「샹들리에가 있는 고서점」_42
김중식 「꽃」_44
김태형 「염소와 나와 구름의 문장」_46
나희덕 「종이감옥」_48
류인서 「개종」_50
맹문재 「초두부 한 그릇」_52
문정희 「거위」_54
문태준 「불안하게 반짝이는 서리처럼」_56
민병도 「나팔꽃 시편」_57
박기섭 「믐빛」_58
박명숙 「능소」_60
박시교 「고백」_61
박찬일 「상징으로 남겨 놓으시게」_63
박현덕 「가을 능주역」_64
박형준 「실보 고메라」_66
박희정 「하얀 두절」_69
변종태 「은행나무 아래서」_70
손영희 「문산 택시 승강장에서」_72
신용목 「지나가나, 지나가지 않는」_74
신필영 「물망초 시편」_76
안희연 「고리」_78
양문규 「큰으아리」_80
엄원태 「가을의 묵서」_82
오승철 「꽃타작」_84
오종문 「한밤, 충蟲을 치다」_85
유안진 「아내에게 순종하다」_86
유재영 「이슬」_87
이규리 「일회용 봄」_88
이기철 「저 식물에게도 수요일이 온다」_90
이덕규 「그땐 좋았었지, 불타면서」_91
이명수 「12초 동안」_93
이문재 「풍등風燈」_95
이상호 「나무」_97
이숙경 「야싯골 다랑이」_99
이시영 「형제를 위하여」_101
이우걸 「시집」_102
이은규 「매핵梅核」_104
이은봉 「짐승」_106
이재무 「국화 앞에서」_108
이정환 「시스루」_110
이태수 「유리창」_112
이태순 「가시」_114
임성구 「아련함에 대한 보고서」_116
임채성 「곰소항」_118
장석남 「사랑에 대하여 말하여 주세요」_120
장석원 「장맛비를 쏟아내는 하역 노동」_122
장옥관 「검은 징소리」_124
장이지 「가파도」_126
장재선 「피에타 앞에서 우는 여자에게」_128
전기철 「으슬」_130
정끝별 「봄의 사족」_131
정용국 「눈이 몰고 온 시」_133
조승래 「가족 사진」_134
조용미 「내가 없는 거울」_135
조정인 「모과의 위치」_137
진은영 「천칭자리 위에서 스무 살이 된 예은에게」_139
차주일 「기우는 동그라미」_143
천수호 「눕듯이 서듯이 자작자작」_145
천양희 「엉뚱한 생각」_147
최동호 「난세의 춘란」_149
하재연 「검은 도미노」_150
함기석 「수학자 누Nu 16」_152
함명춘 「귀천」_155
2 0 1 7 오 늘 의 시 집
고 은 시집 『초혼』_162
길상호 시집 『우리의 죄는 야옹』_164
김민정 시집 『아름답고 쓸모없기를』_166
김혜순 시집 『피어라 돼지』_168
나태주 시집 『꽃장엄』_170
도종환 시집 『사월 바다』_172
17시 1-13 1904.1.9 1:28 AM 페이지9
서정춘 시집 『이슬에 사무치다』_174
송찬호 시집 『분홍 나막신』_176
신달자 시집 『북촌』_178
이달균 시집 『늙은 사자』_180
이선균 시집 『언뜻,』_182
이승은 시집 『얼음 동백』_184
이장욱 시집 『영원이 아니라서 가능한』_186
이종문 시집 『아버지가 서 계시네』_188
장철문 시집 『비유의 바깥』_190
허 연 시집 『오십 미터』_192
홍성란 시집 『바람의 머리카락』_194
황동규 시집 『연옥의 봄』_196
‘오늘의 시’기획 좌담 _ 시 기획위원
2017년 한국 시의 지형과 지향_198
나희덕 시인 인터뷰 _ 나민애
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리게 하는 것_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