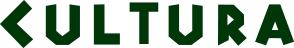내과의사이자 책방주인인 김강 작가의 새 소설집 『착하다는 말 내게 하지 마』가 도서출판 작가에서 출간되었다. 저자 김강은 2017년 단편 소설 「우리 아빠」로 21회 심훈 문학상 소설 부문 대상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소설집 『우리 언젠가 화성에 가겠지만』(2020), 『소비노동조합』(2021), 장편소설 『그래스프 리플렉스』(2023)과 다수의 공동소설집을 출간하며 맹렬하게 문단활동을 펼치는 현역작가이다.
이번에 펴낸 소설집 『착하다는 말 내게 하지 마』에 실린 작품들은 나와 우리, 존재와 관계의 이중성이 부딪치고 엇갈리는 지점마다 찍어둔 좌표들이다. ‘용의자 A의 칼에 대한 참고인 K의 진술서’에서 시작된 그의 비타협적인 질문은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는’ 마지막 순간까지 끝나지 않는다. 「용의자 A의 칼에 대한 참고인K의 진술서」를 비롯한 「아담」 「민의 순간」 「으르렁을 찾아서」 「착하다는 말 내게 하지 마」 「검은 고양이는 어떻게 되었나」 「그는 집으로 돌아와 발을 씻는다」 등 총 7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었다.
인간의 본원적 폭력성과 공동체를 향한 윤리감각
김강의 작가적 레이더가 가장 날카롭게 반짝이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문제 삼을 때이다. 이번 작품집의 입구에 놓인 「용의자 A의 칼에 대한 참고인 K의 진술서」는 공동체에 대한 김강의 예민한 인식을 제대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용의자 A의 칼에 대한 참고인 K의 진술서」에서는 수십 년의 시간을 격한 두 개의 서사가 나란히 진행된다. 병렬되는 두 개의 서사는 어린 시절에 아파트 공터에서 1동과 2동 아이들이 연탄재를 가지고 벌이던 전쟁놀이와 사소한 일로 동네 사람들이 갈등을 벌이다가 살인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이야기를 말한다. ‘나’는 어린 시절의 연탄재 전쟁에서나 지금의 살인사건에서나 뜻하지 않게 범행도구를 제공하는 역할을떠맡게 된다.

“명확히 해두어야겠습니다. A의 손에 쥐어져 있던 칼은 저의 칼이 아닙니다. 제 손에 오만 원권 지폐가 쥐어지던 순간 그 칼은 A의 칼이 된 겁니다. 이론의 여지없는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나’는 마지막까지 항변하지만, 그가 조금만 더 A의 주변 상황에 관심을 기울였다면 ‘얇고 뾰족한, 비교적긴 칼’을 아무런 걸림 없이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이다.
‘착하다는 말 제게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착하다는 말 내게 하지 마.’라고 대답하기
김강이 제시하는 새로운 가능성은 전혀 상투적이지 않다. 그는 자발적 개인의 담대한 주체선언을 중요시한다. 이러한 작가적 인식을 간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이 바로 「착하다는 말 내게 하지 마」이다.
이 작품의 ‘나’는 유흥주점에 갔다가 세희라는 여성과 인연을 맺게 된다. 세희는 옛날 ‘내’가 돌보던 환자의 딸이었다. ‘나’는 무수한 입원 당시 주치의 중의 한 명이었고, 세희 아버지의 사망선고를 내렸던 의사였다. 세희의 아버지 김완수가 인공호흡기를 단 지 한 달이 지났던 그날, 술에 취한 세희는 병원을 찾아와 “인공호흡기 뽑아달라고, 환자가 그저 죽게, 그냥 가만히 좀 두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친다. 결국 ‘나’는 매뉴얼에도없는 문장까지 서약서에 쓰도록 강제한다.
“나는 현재의 치료가 중단될 경우, 환자, 즉 나의 아버지인 김완수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판단하며, 이 판단에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매뉴얼에도 없는 이 문장을 불러주며 세희 남매가 “종이를 찢어버리고 서로를 부둥켜안으며 주저앉는 것으로 오늘의 일이 마무리”되거나, 그렇지 않다면 마지막 문장이 “결코 잊히지 않는 한마디가 되어 그들의 삶을 괴롭혀야 한다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나’의 의도는 반은 이루어지고, 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희는 종이를 찢어버리지는 않았지만, 대신 지금까지도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세희는 ‘나’에게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서 “내가 우리 아빠 죽인 것 아니죠? 그렇죠?”라고 묻는다. ‘나’는 천사 같은 태도로 “그래. 원래 그렇게 하는거야. 세희가 죽인 것 아니야. 넌 착한 딸이었어.”라며, ‘따뜻한’ 반말로 응대한다. 그러자 “빨간 실핏줄이 가득한 눈”으로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던 세희는 “착하다는말 내게 하지 마.”라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호한 반말로 대답한다. 세희는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당당하게 자신이 당당한 주체임을 선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경재 평론가는 해설에서 “김강은 사르트르가 말한 ‘영구혁명의 담당 기관으로서의 소설가’이자 시대의 스승을 자처하는 ‘문사로서의 소설가’라는 문학사적 전통 위에 서 있 “고 “그의 소설은 늘 공동체의 올바른 존재양태에 대한 탐색과 그것을 가로막는 힘에 대한 비판정신으로 가득하다”며 “실로 소설의 본령에 해당하는 이러한 영역은 한동안 한국소설계에서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었던 부분”이라고 평한다.
이처럼 문사의 계보를 잇는 김강의 소설집 『착하다는 말 내게 하지 마』는 예민한 감각으로 인간의 원형을 탐구하며 동시에 공동체의 올바른 윤리성을 좇는다. 그의 날카로운, 어쩌면 과도한 윤리 의식이 지금 우리 시대에 가장 우선되는 요구는 아닐는지. 김강의 감동이 있는 문학 클리닉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의 빛나는 감수성과 윤리감각을 깨워보길 권한다.
* 《쿨투라》 2024년 9월호(통권 12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