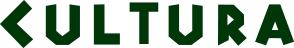요나스 메카스의 〈우연히 나는 아름다움의 섬광을 보았다〉는 러닝타임이 장장 288분에 달했다. 보통 이 정도 긴 영화는 인간적으로 ‘인터미션’을 주지 않나. 이를테면 〈고령가 소년 살인사건〉이나 〈벤허〉 완전판 같은 것들. 그런데 이 영화는 그마저 없었다. 감히 흐름을 끊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이.
게다가 이 작품은 ‘보편적인 영화의 재미’와는 완벽하게 담을 쌓은 영화였다. 작가의 개인적인 아카이브를 모자이크처럼 이어다 붙인, 일정한 줄거리도 변변한 대사도 없는 실험적인 다큐멘터리. 누가 영화의 앞을 떼어다가 뒤에 몰래 붙여 놨다 한들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영화를 대체 누가 볼까 싶었지만, 그날 서울아트시네마에는 빈자리가 없었다. 그리고 이 악랄한 영화를 보면서도 누군가 도중에 나가는 기척도 전혀 없었다.
나름 각오를 했음에도 200분이 넘어가자 슬슬 고비가 찾아왔다. 내 자리는 1열에서도 제일 측면이었다. 목과 허리가 당장이라도 부러질 것 같았고, 직격으로 쏟아지는 에어컨 바람이 체온을 마구 떨어트리는 최악의 조건이었다.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 끝물이라 영화관에서는 마스크 의무화가 해제되지 않은 시기였다.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버틴 건 팽팽하게 흐르던 실내의 공기 때문이었다. 나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뛰쳐나가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의 자존심과 오기가 쟁투를 벌이고 있는 걸 피부로 느꼈다. ‘여기서 나가는 자는 시네필이 아니다!’, ‘심장을 바쳐라!’ 그 순간 속으로 좀 웃었다. 사실 나도 그랬다.

사지를 뒤틀어가며 참고 참아 네 시간을 넘길 즈음, 그 순간이 찾아왔다. 아, 이거였어, 바로 이거구나, 이래서 그 지난한 모든 걸 참고 기다렸구나, 싶은 순간이. 그 느낌은 결코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아, 깜짝이야’ 하는 각성의 순간도 아니었으며, 논리적인 설명은 더더욱 불가능했다. 그저 어느 틈에 누군가에게 곁을 내어준 듯 불현듯 옆에 앉아 있었다. 크레딧이 올라가고 불이 켜진 후, 마스크 위로 보이는 어떤 사람들의 표정에는 피로와 당혹감이 역력했지만, 또 몇몇 사람의 눈빛에 흔적처럼 찍혀 있던 무언가를 나는 얼핏 보았다. 저들도 느낀 거구나. 그 순간을 마주한 거야. 나와 같은 방향을 본 거야. 제목 그대로 섬광처럼 스쳐간 아름다움을. 그 느낌은 옅은 감기처럼 며칠이나 몸을 감싸고 있었다.

지금도 생각한다.
본 기사의 전문은 추후 공개됩니다.

최승우 텍스트 노동자. 잡다하게 읽고 보고 듣고 씁니다. 지속가능하게 노는 법을 늘 궁리 중.
* 《쿨투라》 2024년 10월호(통권 12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