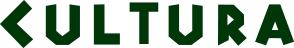배우 이정재가 또 한번 전진했다. 그는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흥행을 일구며 세계적인 스타로 우뚝 섰다. 이미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서 한류스타로 군림하던 그가 유리천장을 재차 뚫은 셈이다.
그리고 불과 1년도 흐르기 전, 이정재는 다시금 세차게 비상했다. 이번에는 ‘배우’가 아니라 ‘감독’으로서다. 그는 영화 <헌트>의 감독 자격으로 지난 5월17일(현지시간) 개막한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받았다. <헌트>는 칸영화제의 여러 섹션 중 “가장 재미있는 영화를 모았다”고 평가받는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서 공식 상영됐다.
칸은 이정재에게 낯선 곳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0년 임상수 감독의 영화 <하녀>로 한 차례 칸을 경험했다. 당시 이정재는 취재차 함께 칸에 온 기자들을 직접 한 프랑스 식당으로 초대했고 <하녀> 속 주인공의 모습으로 와인을 한 잔씩 따라주는 팬서비스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12년이 시간이 흘러, ‘감독 이정재’로 우뚝 선 그를 지난 21일 칸 팔레 데 페스티벌에서 만났다.
“<하녀> 때 경험한 칸영화제는 너무 화려하고 멋진 곳이었다. ‘여기 한번 다시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때 같이 오신 분들은 ‘깐느 병 걸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웃음) <헌트>의 원작 「남산」의 판권은 5년 전 구입했다. 그때도 한국영화들이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었지만 제가 감히 감독으로서 이 영화제에 올 것이란 상상조차 못했다.”

<헌트>는 두 남자를 중심으로 한 첩보물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한국 현대사의 생채기가 가득하다. 민주화 운동과 그를 진압한 세력을 비롯해 한국의 현대사를 거론하며 빼놓을 수 없는 굵직한 사건들이 꾹꾹 눌러 담겼다. 그래서 <헌트>를 보고 있노라면 영화적 재미를 느끼는 동시에 가슴 한 켠이 먹먹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선택한 소재일 수도 있다. 시나리오를 제 손으로 고치기 시작하면서 한국 뿐만 아니라 해외 관객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주제를 고민했다. 해외 관객들이 보기에도 흥미로운 이야기여야했다. 현재로 배경을 바꾸려는 고민도 했지만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게 전체 주제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다. 이런 선택을 하고 나니, ‘영화제에 나가 더 많은 분들과 이 주제로 소통하고 싶다’는 꿈도 꾸게 되더라.”
이정재는 1993년 데뷔 후 30년 가까이 배우로 살았다.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스타덤에 오른 그의 가장 큰 수확은 30년간 별다른 기복없이 그 자리를 유지해왔다는 것이다. 여기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복까지 품에 안기며 이대로 배우로서의 삶을 만끽해도 될 법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 ‘감독’이라는 험지로 걸어 들어갔다.
“감독으로서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야 했다. 스태프와 배우들이 혼선없이 움직이고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것이 연출자가 할 일이었다. 첫 콘티 회의 때 스태프들과 만나 작품의 폭을 정하고 그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많은 밑작업을 했다. 카메라 감독과는 배경에 맞춰 포인트 의상을 정하는 등 색감을 맞추는 것이 첫 회의 때 한 일이었다. 이런 준비 덕에 많이 갈팡질팡하지 않았던 것 같다.”

<헌트>와 함께 한 5년간의 여정은 험준했다. 원래는 다른 감독에게 연출을 맡기기 위해 몇 차례 미팅도 가졌다. 하지만 다들 손을 들고 나갔고, 표류할 무렵 이정재는 직접 메가폰을 쥐기로 결심했다. 200억 원이 넘는 자본이 투입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였다. 이를 초보 감독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험이었다. 그리고 이정재는 기꺼이 그 모험에 투신했다.
“남자배우니까 스파이물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 근래 근사한 스파이물을 보기 힘들었다. 그러다 「남산」이라는 작품이 스파이물로서 소재적인 면에서 괜찮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정지우 감독, 한재림 감독 등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여의치 않았다. 원래 박평호 원톱 구조였는데, 김정도라는 인물을 만들어 투톱 체제로 바꾸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두 남자의 이야기로 바꾸는 과정은 지난했다. 하지만 그 터널의 끝은 달콤했다. 23년 전 영화 〈태양은 없다〉에서 방황하는 두 청년을 연기했던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을 다시 한 번 한 프레임에 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정우성은 “압구정 뒷골목을 전전하던 홍기와 도철이가 칸에 왔다”고 농담을 던졌고, 이정재는 “두 배우를 함께 출연시키기 위한 명분을 얻었다”고 진담했다.
“전 세계에서 정우성을 제일 멋있게 찍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더 멋있게 찍어줄 감독이 나오길 바라지만, 지금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와 <태양은 없다>를 연출한) 김성수 감독보다 이정재가 정우성을 ‘더 멋있게 찍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헌트>에서 정우성은 멋있게 보여야 하는 숙명을 가진 캐릭터를 맡았다. 행복보다 생각이 더 섹시하고 멋진 인물이다. 그런 콘티를 영상으로 옮기기 위해 배우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정재와 정우성, 두 배우의 재회에 주변이들도 들떴다. <헌트>에 동참하겠다고 줄을 섰다. 그 결과 황정민, 이성민, 정만식, 김남길, 주지훈, 조우진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이 영화의 조·단역으로 참여했다. 캐릭터의 성격도, 출연 분량도 중요치 않았다. 이정재 감독이 찍고 두 배우가 한데 어우러지는 현장에서 그 공기를 함께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의미있었기 때문이다.
“저희가 섭외 부탁을 드리진 않았다. 동료 선후배우들이 저와 정우성이 함께 출연하는 것을 너무 기다려왔다고 하더라. 그 축하하는 의미로 작은 역할이라도 하겠다고 자처했다. 처음에는 한 두 분씩 참여했는데, 점차 소문이 나면서 몰려들더라.(웃음) 하나의 잔치같은 분위기가 됐고 마음이 짠해질 정도로 고마웠다. ‘둘이 같이 열심히 산 보람이 있구나’할 정도로 가슴이 뭉클했다. 그들이 나온다면 흥행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추억이기 때문에 그 추억이 담긴 영상물을 의미있게, 잘 만들고 싶었다. 마치 생일잔치 같은 느낌이었다.”
칸의 여정을 마친 그에게 “다음 연출작은 무엇이냐?”는 질문이 쇄도한다. 하지만 이정재는 손사래부터 친다. 감독의 위치에서 이정재라는 배우를 객관화시키며 연기하는 과정이 너무도 힘들었던 탓일까?
“다음 연출 계획은 전혀 없다. 사실 <헌트>가 없었다면 감독 데뷔도 없었을 것이다. 연출에 대해 욕심낸 적은 없다. 연출자는 시나리오를 직접 써야 하는데 그 부담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헌트>를 찍는 내내 이정재가 이정재를 보고 평가해야 하는 점이 아쉬웠다. 더 좋은 감독님이 이정재를 이끌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 《쿨투라》 2022년 6월호(통권 9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