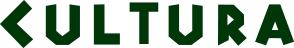아트사이드갤러리 전시전경. 사진: 작가 제공
수면과 아래
우리는 ‘빙산의 일각一角’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런데 정작 그 빙산의 나머지 각들을 360도 돌아가며 보거나, 수면 위로 솟아난 빙산의 부분을 제외한 전체 또는 하부구조를 들여다보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 사실 인간의 감각과 인식은 시공간적 제약을 받기에 부분과 전체를 일망타진一網打盡하듯 파악하는 시선이란 시쳇말로 ‘탈 인간계급’ 정도는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래서 파편적이고 측면에 불과한 이해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기존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추론, 예지, 관점 공유와 협업 등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상상력을 발휘해 이미지를 구상하거나 사변을 꿰어봄으로써 가시성의 표면 아래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실체 혹은 그것에 가까운 무엇을 드러내야 한다.
미술, 특히 특정 유형의 형상회화figurative paintings가 그러한 감각적 이해와 시각화에 유효한 장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르네 마그리트René Magritte(1898-1967)의 초현실주의 회화, 조르조 데 키리코Giorgio de Chirico(1888-1978)의 형이상학파metaphysical art 그림들, 마우리츠 코르넬리스 에셔Maurits Cornelis Escher(1898-1972)의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판화들이 그렇다.

사진: 작가 제공
작가 송명진의 회화를 비평하기 위해서 마그리트, 키리코, 에셔 같은 미술사의 큰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이 거창해보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 2010년대 전반 한창 한국 미술계에서 일명 ‘녹색그림’으로 주목받다가 십여 년 간 사라졌던 송명진이 개인전 《Shall We Dance》(아트사이드갤러리, 2024. 11. 28 - 12. 28)에 들고 나온 형상회화는 그 세 초현실주의 화가들의 미학적 세계관에 닿아있다. 녹색을 중심으로 양식화한 풍경을 그리던 당시 이 작가의 그림은 모더니즘 회화의 평면성과 그래픽아트의 삽화적 성격이 결합된 신선한 그림들로 보였다. ‘신선’이라는 단어 그대로 푸르른 색채와 젊은 작가 특유의 경쾌한 표현 스타일이 돋보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전시 활동을 멈췄다가 재개한 이번 개인전에서 송명진의 그림들은 조형적 요소도 중요하지만 한층 그림의 내용이 의미심장한 쪽으로 강화된 양상이다. 앞선 ‘녹색그림’이 색, 묘사 기법, 모티프의 디자인 같은 형식주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그림들은 화면의 형상과 배경이 의미를 가득 머금은 담론적discursive 장면처럼 구축되었다. 형상회화가 이와 같은 담론 가능성, 의미의 잠재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나는 송명진의 신작을 마그리트, 키리코, 에셔의 미술에 잇대어 본다. 또한 그들의 그림이 말과 단어를 쓰지 않고 인간 앎의 설명할 수 없는 차원이나 이성/의식 아래 어떤 세계에 관한 상상을 부추기는 힘을 가졌다는 점에서 송명진의 작업이 가(고 있)는 방향을 미리 본다.
왜 춤추자는 것일까?

사진: 작가 제공
송명진의 이번 개인전 제목은 대중에게 꽤나 익숙하고 상투적인 것이다. 1937년 프레드 아스테어Fred Astaire와 진저 로저스Ginger Rogers가 주연한 동명의 뮤지컬영화부터 1951년 율 브리너Yul Brynner와 데보라 카Deborah Jane Karr가 함께 왈츠를 춘 명화 〈왕과 나〉의 주제곡, 1996년 스오 마사유키 감독의 영화 〈쉘 위 댄스〉, 그리고 2000년대 댄스스포츠를 소재로 한 국내 TV 연예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거듭 반복된 덕분이다. 하지만 미술작품과 전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그 제목은 기이한 점이 없지 않다. 그림 전시에 춤을 연관시켜서만은 아니다. 알다시피 현대예술은 다원화된 지 오래다. 게다가 과거 조형예술과 공연예술로 나뉘었던 장르들이 혼성과 융합 실험을 거듭하고 있기에 새삼 페인팅과 댄스를 결합한다 한들 기이해 할 것이 없다.
하지만 송명진의 《Shall We Dance》는 오로지 그림들로만 이뤄진 전시고, 그 점에서 전혀 다른 맥락으로 ‘춤추실래요’라고 요청한다. 거기에는 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 것 같다. 먼저, 송명진은 자신의 그림들이 그려지고 완성되기까지 작가와 그림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호한 작업 경로와 우발적인 표현 효과를 둘이 추는 춤으로 제유한다. 그 경우 작가가 이번 도록에 쓴 글에서처럼 “그림은 늘 작가로부터 도망”침으로써 오히려 작가로 하여금 미지의 완성 단계까지 좇아오게 만든다.
둘째, 송명진이 신작 회화를 통해 춤추자는 대상은 자기 그림/전시의 관객이다. 작가가 작업 과정에서 그림과 일종의 듀오를 이뤄 도달한 그림의 결과는 작가의 원래 의도나 정해진 메시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신 페이스트리 반죽처럼 그림의 가시적 표면들 사이사이로 무수한 담론의 공기층이 형성되어 감상자의 주관성이 거기로 들고나고 할 수 있다. 그림 속 형상들을 보며 제멋의 이야기를 꾸며내도 좋고, 화면에 묘사된 상황으로부터 프리퀄과 시퀄, 전면과 이면의 내러티브를 엮어나가도 좋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송명진은 “이제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나누려는 작가”로서, 그런데 명칭은 “파트너를 무대 위로 청하는 댄서처럼” 스스로를 명명하면서 자기 그림의 감상자들에게 유동적인 해석을 권한다.1
세 번째로 왜 ‘춤추실래요’인가에 대해서는 인생에 관한 좀 더 통속적 사변이 필요하다. 앞서 썼듯이 송명진은 근 십 년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미술계 활동은 물론 작업하는 일조차 여의치 않았다. 누구나 인생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변고를 겪는데 이 작가 또한 그런 인생 경험을 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작가의 사적 삶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기보다는 더 큰 것을 탐색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를테면 나와 당신은 송명진이 고단한 경험 이후 세상에 내놓은 《Shall We Dance》 전시작들을 매개로 생生의 보이지 않았던 측면을 숙고해보는 것이다. 더 정확히는 인생이라는 빙산의 일각을 벗어나 다른 각들, 삶의 가시적 현상들이 품고 있는 다른 암묵적 차원을 작가가 어떻게 형상화했는가, 우리는 또 어떻게 그것에 저마다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겠는가 생각해보는 것이다.
느슨한 죽음, 두 개의 섬, 핑거 플레이 etc.

사진: 작가 제공
송명진의 《Shall We Dance》에서 대표작은 갤러리 1층 전면에 걸린 대작 〈느슨한 죽음〉(2014)이다. 작품명이 지시하는 ‘느슨한 죽음’은 가느다란 줄에 내걸린 여러 가닥의 긴 관管으로 형상화되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볼륨감과 리듬감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연약한 내장인지 질긴 고무 튜브인지 그도 저도 아니면 중심이 빈 익명의 물체들인지 알 수 없는 모양새다. 그저 검고 단조로운 배경 앞에 텀블링하듯 돌돌말리고 늘어뜨려진 옅은 갈색 관들로만 보인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특히 그/녀의 신체에 가해지는 자연의 가혹한 파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이라면 송명진의 〈느슨한 죽음〉은 시각적 충격이자 트라우마의 트리거일 것이다. 그것이 필멸의 자연 질서가 유한한 생명에게서 인격을 탈취하고 부속물만 남겨놓은 존재 상태를 기억나게 해서다. 기관organ에 조차 연결되지 못한 채 물 먹은 빨래처럼 운명 줄에 축축 걸린 내장의 처참한 풍경. 그럼 〈느슨한 죽음〉은 무엇을 위해 관객에게 춤추자고 할 것인가. 현실에서 그런 요청은 가학적이어서 곤란하다.
이즈음에서 내가 앞서 ‘암묵적’이라고 말한 내용을 개념 정리하고 가자. 헝가리 출신의 영국 과학철학자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1891-1976)는 애초 물리화학자로 쌓은 업적을 뒤로 하고 1949년 과학철학자로 전향해 인간 지성의 실증적 차원 너머를 학술적으로 해명했다. ‘암묵적 차원 이론Theory of Tacit Dimension’이 그것이다. 폴라니에 따르면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축적된 경험과 사고 및 행위 습관, 학습 방법과 훈련 절차에 따라 개인적으로 형성되는 앎의 차원이 있다. 인간 인지의 “잠재적 차원” 또는 “하부구조”라 할 수 있는데, 폴라니는 그것을 “암묵적 앎tacit knowing”으로 묶어 정의했다.2
객관적 언어로 서술하거나 수학 공식 같은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명시적 지식과 달리, 암묵적 앎은 말/언어/기표로는 전부 표현할 수 없는 차원에 속한다. 폴라니는 특히 과학자와 예술가의 경우에서 그 암묵적 차원의 앎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전문 영역에서 주체는 도제식 교육과 어깨 너머의 경험, 반복 실험과 새로운 도전을 거듭하는 동안 전체 맥락에 대한 이해가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직관, 추론, 예측, 예견, 분석력, 상상력이 비상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정도는 다르지만 과학자나 예술가가 아닌 일반인들 또한 암묵적 차원의 앎 또는 역량을 갖고 있다. 모두가 자신만의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생을 꾸려나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해석하면, 송명진이 자신의 그림들과 전시를 통해 관객에게 춤추자고 한 요청은 말이 된다. 작품에 대한 저마다의 그림 감상과 저마다의 의미 부여가 작가의 그것과 커플링 되거나 디커플링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진: 작가 제공
다른 한편, 송명진의 〈두 개의 섬〉(2018, 2024)과 〈어떤 시점〉(2018, 2023)시리즈는 폴라니의 ‘암묵적 차원’에 관한 시각적 도해처럼 여겨진다. 〈두 개의 섬 1〉에서 수면 위 혹은 지표면의 상층에 드러난 것은 단순하고 명쾌한 하나의 반원과 약간 긴 줄의 관이다. 만약 당신이 그 그림을 보게 된다면 그림의 하부 3/4 부분을 가리고 그 위 1/4의 회색 면에 묘사된 간단한 형상에 집중하기 바란다. 그러면 그 3/4 범위에 그려진 우글거리며 뒤얽힌 관과 딱딱하게 뭉쳐져 울퉁불퉁해진 어떤 덩어리가 상부의 숨겨진 뿌리라는 점이 대조적으로 느껴질 것이며 반전의 숨은 의미를 생각해보게 될 것이다. 누군가의 감상을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겠다. 다만 내게 〈두 개의 섬 1〉은 체념하며 수긍하기에는 분노가 이는 세상의 진실, 말하자면 이면과 하부에서 작용하는 괴물 같은 무질서와 그 표면 위에 현상되는 매끈한 합리성을 연상시켰다.
전시의 메인 작품 중 하나인 〈Shall We Dance 1, 2, 3, 4〉(2024) 연작은 해석의 스펙트럼이 제한된 듯 하면서도 모호하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인간인 듯 인간 아닌 형상들이 하는 집단적 행위를 시각화한다. 마치 올챙이국수 알갱이를 의인화한 것 같은 그림 속 미물微物 캐릭터들은 허공 속 검은 어딘가에서 조종하는 진자의 운동에 따라 이리저리 떼로 휩쓸린다. 서로의 입(?)과 항문(?)이 맞닿도록 밀착한 채 원무圓舞를 추면서 위로 기어오르기도 한다. 또는 온몸이 확성기가 되어 진자에 맞선다. 그림에서 묘사된 바,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 움직이는 추들과 초현실주의적 등장인물 군집은 이렇게 정치적이거나 사회 비판적인 해석에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우매한 집단성에 대해서, 저렇게 보면 그 집단이 잠재한 저항과 해방의 방식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작가가 “흔들리며 함께 추는 춤”을 요청했으니 〈Shall We Dance 1, 2, 3, 4〉에 대한 관객의 독해가 명시적 무보舞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익숙한 사고의 논법 전개 대신 이미지에서 이미지로, 현실에서 그것이 초과된 현실로 건너다니며 보아도 좋다는 말이다.
송명진의 또 다른 연작 〈Finger Play 1, 2, 3〉가 특별한 이유가 여기 있다. 그 크지 않은 그림들은 우리가 어릴 적에 자신의 손가락을 써서 했던 놀이를 기억나게 한다. 검지와 중지를 마치 사람의 다리인 양 여기며 걷게 하고, 삐딱하게 기대서게 하고, 그러다가 건너편 친구의 손가락-다리 인간과 만나고 따위…. 이처럼 나는 그 그림들을 앞에 두고 유년기에 손가락 놀이를 하며 사람들이 만들던 환상, 그 환상의 허구성과 초현실성 때문에 성장하면서 점차 명시적 지식과 객관적 정보에 밀리고 눌린 성인의 암묵적 앎을 생각한다. 우리의 심리와 정서 깊은 곳에, 무의식에, 상처 속에, 슬픔 속에 차곡차곡 침전된 그 상상적 앎들에 대해.
1 이상 인용문은 송명진, 《Shall we dance》 전시도록, 2024에 수록된 작가의 글이 출처임.
2 Michael Polanyi, The Tacit Dimension, (New York: Doubleday & Company Inc.), 1966, pp. 13-20.

강수미 미학. 미술평론. 동덕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회화과 부교수. 『다공예술』, 『아이스테시스: 발터 벤야민과 사유하는 미학』 등 다수의 저서, 평론, 논문 발표.
주요 연구 분야는 동시대 문화예술 분석, 현대미술 비평, 예술과 인공지능(Art+AI) 이론, 공공예술 프로젝트 기획 및 비평. 현재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봉사센터 센터장, 서울특별시 박물관미술관진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미학예술학회 기획이사 및 편집위원, 《쿨투라》 편집위원.
* 《쿨투라》 2025년 1월호(통권 1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