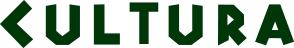수상한 후 한국 작가들에게도 이제 노벨문학상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다. 노벨문학상뿐만 아니라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국제적인 문학상 후보에 한국 작가들의 이름이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또 수상을 하면서 한국음악이나 한국영화처럼 바야흐로 한국문학에도 꽃 피고 새 우는 황홀한 봄이 도래하고 있다. 한국 근현대문학사를 뒤돌아볼 때 그동안 뛰어난 작품을 써왔던 작가가 유독 많았던 우리나라의 문학 수준을 고려하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또 어찌 보면 때늦은 일인지도 모른다. 참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1901년 프랑스 시인 쉴리 프뤼돔을 첫 수상자로 배출한 이래 120년이 훌쩍 넘은 노벨문학상의 역사에서 아시아는 인도의 라빈드라나트 타고르(1913),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1968)와 오에 겐자부로(1994), 중국의 모옌(2012) 이후 다섯 번째 수상자를 배출한 셈이다. 그리고 그 작가들은 모두 시인이나 소설가들이다. 개인의 정체성과 자유, 정치적 억압을 주제로 실험적인 성격이 강한 희곡을 발표했던 중국 출신의 가오싱젠이 극작가로는 유일하게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던 2000년에 수상했지만 정치적인 이유로 망명한 그의 국적은 프랑스였다.
역대 노벨문학상 수상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나 T. S 엘리엇, 파블로 네루다, 넬리 작스, 옥타비오 파스, 셰이머스 히니, 비스와바 심보르스카 같은 유명한 시인이나 토마스 만, 펄 벅, 헤르만 헤세, 앙드레 지드, 윌리엄 포크너, 어니스트 헤밍웨이, 알베르 카뮈,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토니 모리슨, 오르한 파묵, 르 클레지오처럼 널리 알려진 소설가들이 대부분이지만 우리 귀에 익은 극작가들도 꽤 많다.

첫 수상자는 1904년에 작품 『미치광이 또는 성자』로 상을 받은 스페인의 극작가 호세 에체가라이였다. 이어 수상자 면면을 살펴보면, 『파랑새』의 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 『피그말리온』으로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 한국에서 자주 공연되는 『작가를 찾아가는 여섯 명의 등장인물』의 루이지 피란델로, 『어느 무정부주의자의 우연한 죽음』을 발표하고 연출까지 겸했던 다리오 포 같은 유럽의 극작가들이 주를 이루지만 드물게는 『사자와 보석』, 『해설자』 같은 작품을 남긴 아프리카 최초의 수상자인 나이지리아 출신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월레 소잉카도 포함돼 있다. 또 새천년인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사뮈엘 베케트, 외젠 이오네스코, 페르난도 아라발과 함께 실험극의 기수로 꼽혔던 영국의 해럴드 핀터와 한국 관객에게 『관객모독』이라는 희곡으로 잘 알려져 있는 소설도 겸업했던 오스트리아의 페터 한트케도 그 명단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동문학분야에서는 『닐스의 모험』을 쓴 스웨덴의 셀마 라게를뢰프가 유일하다.)
그 많은 작가들 중에서도 한국인에게도 아주 친숙한 극작가는 1936년에 상을 받은 미국 현대 드라마의 아버지로 불리는 유진 오닐이 아닐까. 『지평선 너머』 와 『느릅나무 밑의 욕망』 『상복이 어울리는 엘렉트라』 『밤으로의 긴 여로』 같은 대표작을 비롯해서 「고래」나 「밧줄」, 「카디프를 향해 동쪽으로」 같은 걸출한 단막극을 발표한 사실주의 희곡의 대가이자 브로드웨이의 상업성에 치우친 대극장 문화에 반발하면서 소극장 운동을 새롭게 시작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의 영향을 받아 테네시 윌리엄스와 아서 밀러 같은 후배 극작가들이 등장해서 미국 드라마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문학적인 업적은 대단했지만 오닐의 삶은 불행했다. 아버지가 떠돌이 배우였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제대로 된 집이 아닌 호텔을 전전하면서 살아야했고 그 때문인지 오닐도 호텔 방에서 태어나 호텔 방에서 생을 마감했다. 아내와의 사이가 나빠져 두 번이나 이혼했고 딸 우나 오닐이 오닐 자신과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는 찰리 채플린과 결혼하려 하자 한평생 관계를 끊고 지내기도 했다. 사후 출간된 『밤으로의 긴 여로』는 그의 신산했던 가정사가 잘 드러난 자전적인 희곡이기도 하다.

부조리극의 대명사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 아일랜드 출신의 사뮈엘 베케트도 빼놓을 수 없다. 그 역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극작가 중의 한 사람일 것이다. 그는 한국의 독자들에게 극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초창기에는 시도 썼고 『몰로이』 『말론 죽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자』 같은 개성적인 소설 3부작을 발표한 뛰어난 소설가이기도 하다. 『고도를 기다리며』뿐만 아니라 『승부의 종말』이나 『크라프의 마지막 테이프』 『행복한 나날들』 같은 훌륭한 희곡을 연이어 발표하면서도 늘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나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같은 불멸의 소설을 쓰고 싶어 했다. 그만큼 소설 창작에 대한 열망과 동경이 강했기 때문이다.
베케트는 주로 자신의 모국어인 아일랜드어 대신 프랑스어로 작품을 집필했고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로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희곡이 무대 위에 올라가면 공연을 잘 보러가지 않는 괴짜이자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고 사생활을 잘 노출하지 않는 은둔자였다. 희곡에서 ‘사이pause’를 처음 사용한 극작가로도 유명하고 말년에는 구두점을 전혀 넣지 않은 산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기독교적인 주제에 관심이 많았던 베케트는 죽기 직전까지 단테의 『신곡』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애독했었고 “도전했는가? 실패했는가? 괜찮다. 다시 시도하라. 다시 실패하라. 더 나은 실패를 하라.” 같은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2023년엔 평소에 나 역시 굉장히 좋아했던 노르웨이의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욘 포세가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한국 문단과 연극계에도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욘 포세의 희곡은 시적인 문체에 바탕을 둔 정서적인 대사가 압도적이어서 오랫동안 사건이 많고 갈등이 부각되는 사실주의 연극이 지배했던 한국연극판 안에서는 아주 낯선 작가라고 할 수 있다. 소수의 마니아들이 사랑했던, 읽기도 어렵고 무대 위에도 올리기가 쉽지 않았던 작품이었고 작가였다. 극적인 희곡이 대세인 한국연극 안에서는 시적 정취가 강한 희곡은 주류가 아니라 비주류에 속하는 셈이다.

노벨문학상은 ‘수상작가’에게 수여되는 것이지만 ‘문학작품’에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견해지만 한국연극의 자장 안에서 공연되는 대부분의 희곡들은 노벨문학상의 대상으로 거론되기 어렵다. 국공립극장에서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기획하고 개발하는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공연들도 마찬가지다. 역설적으로 문학성이 강해서 그 말을 붙들고 늘어져야 하는 고단함 때문에 연출가들의 기피대상 목록에 올라있는 희곡들이 어쩌면 노벨문학상의 수상 기준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작품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을 직접 무대 위에 올리지 않는 이상, 공연이 전제가 되는 희곡은 번역가의 ‘번역’이라는 문제 이전에 연출가의 ‘발굴’이라는 과제가 더 남아있다고 해야겠다. 외국의 경우야 차치하고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이라는 특수한 연극 환경 속에서는 한국의 극작가들이 이 벽을 넘지 않고서는 노벨문학상에 근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은 불을 보듯 너무나 뻔한 일이다.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들에게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작가들이 한 장르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주가 되는 장르가 분명 있지만 문학의 전 분야에 걸쳐 창작을 해오고 있고 그러한 추세는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희곡 분야의 수상자도 마찬가지다. 2000년대 이후만 살펴봐도 가오싱젠도 극작가였지만 시와 소설, 비평을 병행해서 써 온 작가이고 해럴드 핀터는 극작가이자 배우였고 연출가였다, 페터 한트케와 욘 포세 역시 희곡과 소설을 같이 써 온 작가들이다. 그러니까 시인이나 소설가, 극작가가 홀로 그리고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문학 혹은 연극의 전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전방위작가’들이다.
본 기사의 전문은 추후 공개됩니다.

최창근 극작가 겸 연출가. 극단 제비꽃 대표. 최근에는 영화감독과 배우로도 활동. 대표 희곡으로 『봄날은 간다』 『12월 이야기』 『강물이 흘러가는 곳』 『입맞춤』 『선인장과 할머니』가 있음. 찍은 영화로 〈단순한 진심〉(조해진 원작) 〈잃어버린 계절〉(김시종 원작) 〈여름의 맛〉(하성란 원작)이 있고 출연한 영화로 〈액션동자〉 〈더 러너〉 〈시인들의 창〉 〈유랑소설〉 〈풀〉(이수정 감독) 등이 있음.
* 《쿨투라》 2025년 1월호(통권 12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