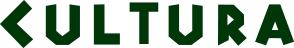재즈에 대해 쓰기 위해, 최근 있었던 일 몇 가지와 오래전 있었던 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싶다. 며칠 전 시네필 친구에게 알리체 로르바케르 감독의 영화를 보고 싶다고 부탁한 적이 있다. 그는 그날 밤 그 메시지를 확인하곤 곧 영화 두 편을 보내주었다. 요즘 나는 큰 병을 회복 중이기에 밤 열시면 재깍 잠이 들곤 한다. 잠들기 전 친구가 보내준 〈네 개의 도로〉를 틀어 보았다. 〈네 개의 도로〉는 8분 정도의 짧은 필름이다. 필름에는 세 갈래 길 끝에 사는 사람들이 등장한다. 동쪽에는 개와 사는 용감하고 우아한 여자, 남쪽에는 비밀 장소에서 매일 꽃을 꺾어와 화병에 꽂는 시인 남자, 북쪽에는 농장의 가족이 산다. 네 개의 도로의 나머지 하나에 사는 것은 필름의 시선이다. 영화의 시작에서 알리체 로르바케르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다.
재즈를 말하며 이 필름을 떠올리는 이유는, 요즘 겪은 우연들 속에서, 재즈란 음악의 한 갈래만이 아니라 움직임, 순간들의 접목, 연결이란 이야기를 하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알리체 로르바케르의 〈네 개의 도로〉를 자기 전 두 번 보고 다음 아침 일어나 한 번 더 보았다. 그날 오후가 되기 전,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네 개의 도로〉는 다큐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답하려다가 주저했다. 우선 나는 아직 그 필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걸 무척 좋아하게 된 것과 달리 그게 정말로 모두 진실인지, 다큐라는 말은 진실에만 해당해야 하는 것인지, 하지만 그렇다면 아무런 작업도 ‘다큐’일 수는 없지 않나 하는 소박한 자가당착이 아침의 몽롱함과 함께 찾아들었다. 나는 친구의 물음에 우물거리는 마음으로 다큐 감독으로서의 경력이 담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쩐지 다큐라는 말을 하기엔 겁이 난다고 답했다. 사실 나는 그 필름이 다큐라고 불리기엔 마법 같은 조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어야 했다.

장르는 닫힌 말이다. 하지만 말은 열릴 수 있고, 아마 그건 대화만이 가능케 하는 일일 것이다. 친구의 말이 순간 다큐라는 말의 결들을 열어보였듯 나는 재즈라는 말도 그와 비슷하게 들린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에 겹친 날 가운데 이런 대화도 있었다. 가족과 일기장들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가 오래전 텔로니어스 몽크 에디션 몰스킨 노트 하나를 구입했던 일을 떠올리게 되었다. 아마도 칠팔 년 전쯤 일이다. 몽크의 앨범들을 모으던 그때의 나는 그 작은 노트의 첫 장에 그 표지와 어울리는 걸 쓰고 싶었다. 하지만 무언가 썼다가 찢어버리고 말았다. 빈 페이지가 아니면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말았고, 그러다 결국은 책꽂이에 꽂아두었다. 다시 한참이 지난 뒤 나는 아빠에게 그 작고 빨간 수첩을 이상한 선물로 건넸다. 지금 그 말을 들은 아빠는 그 수첩이 자기 서랍 어딘가에 아직 들어 있을 거라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서랍을 열지 않았다.

나는 그 작은 수첩이 혹시 서랍이 아닌 책꽂이에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책꽂이의 오래된 자리에서 토니 모리슨의 소설 『재즈』를 발견했다. 그도 아마 칠팔 년 전쯤 대학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이었다. 『재즈』에서 재즈는 음악을 건너 문체가 된다. 목소리, 호흡, 사람들이 된다. 나는 내가 그 소설의 줄거리를 이젠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 빈 자리에는 남겨진 것이 있었다. 연결될 수 있는 호흡 같은 것이었다. 찢어진 수첩의 첫 페이지, 서랍 속에 잠든 것들, 문체의 숨과 리듬, 토니 모리슨과 텔로니어스 몽크는 이렇게 일련의 연주처럼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단서들을 이어붙여 재즈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은 다큐 필름을 만드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 모든 작업은 그런 연결에 대한 추적 같기도 하다. “Jazz is everywhere”라는 말이 그렇듯이, 그것이 어디에나 있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 매순간 연결의 실마리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재즈라는 이름을 단 빨간 수첩의 첫 페이지를 찢어내는 순간을 이 연결의 아늑한 자리에 두고 싶어진다. 잠들기 전 두 번을, 아침에 일어나 한 번을 더 본 마음에 든 필름에 대한 첫 질문에 우물거리며 답하지 못하는 순간과 그 찢겨진 첫 페이지는 서로 닮아 있다.
아마도 환상이겠지만 나는 그 빨갛고 흠없던 수첩의 첫 페이지를 찢어내던 순간을 잊지 않고 있는 듯 하다. 토니 모리슨의 『재즈』를 읽던 도서관의 블라인드 틈으로 보이던 풍경을 기억하는 듯한 기분이 드는 것처럼 그렇다. 그건 마법의 기억들이다.


알리체 로르바케르의 〈네 개의 도로〉에는 천년이 넘은 나무가 나온다. 학자들은 그 나무가 이웃들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오래 산 거라고 말하고, 필름은 마침표를 찍지 않으며 그 말을 거기에 연결시켜두는 데서 마쳐진다. 토니 모리슨의 『재즈』에는 음악도 뮤지션도 등장하지 않는다. 대신 거기엔 과거를 보아야만 하는 사람들의 호흡들이 있다. 그들은 천년을 사는 나무를 닮게 될 것이다.
나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일찍 잠이 들고 아침이면 물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는 친구가 보내준 다른 필름 하나를 더 볼 계획이다. 어쩌면 조만간 어디 두었었는지 잊었던 물건을 다시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여기에는 역시나 재즈라는 말이 어울리는 듯하다. 마침표가 아닌 말, 첫 페이지가 쓰인 수첩처럼 주위와 연결되는 말이다.


최영건 연세대학교에서 국문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국문학과에서 석사 졸업. 문학의오늘 신인문학상,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크로스로드 프라이즈, 쿨투라 미술평론 신인상을 수상. 장편소설 『공기 도미노』와 단편집 『수초 수조』, 공저 『키키 스미스- 자유 낙하』 등. 예술은 기도라는 타르콥스키의 말을 좋아한다.
* 《쿨투라》 2024년 6월호(통권 120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