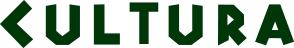국립중앙박물관(관장 윤성용)에서 국내 최초로 과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북미 원주민 문화와 예술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전시를 선보인다.
우리에게 ‘인디언’이라는 단어는 서부영화를 떠올리게 한다. 어두운 피부색과 외지인은 소통 불가능한 원주민 언어, 긴 머리와 그 위에 자리한 깃털 장식 등 대부분이 비슷한 이미지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전형적인’ 원주민, 즉 인디언의 이미지는 미디어가 만들어 낸 일반화의 산물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그간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심도 있게 소개해 왔다. 이번 전시 역시 세계의 문화적 다양성을 소개하는 기획의 일환으로, 미국 내에서도 원주민 미술로 이름난 덴버박물관의 소장품을 엄선하여 북미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 예술을 보여주는 전시로 기획되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북미 원주민의 다양한 문화와 세계관을 보여주는 151점의 전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통칭했던 이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들이 아니라, 풍부한 문화와 역사 속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음을 조명하는 전시인 것이다.
이번 전시를 공동 기획한 덴버박물관은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중부의 대표 박물관으로, 미국 내에서 북미 원주민 예술품을 수집한 최초의 박물관 중 하나이다. 관련 소장품만 18,000여 점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소장품 목록을 자랑하고 있다.

그들은 누구인가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은 누구인지 관람객들에게 질문하며 시작되는 이번 전시는 대중이 북미 원주민 570여 부족을 단일화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고,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다양한 매체와 풍성한 내용을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전하기 위해 서울 전시를 마친 후에는 부산에서 순회 전시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우리가 인디언으로 알던 사람들》전은 총 2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하늘과 땅에 감사한 사람들: 상상을 뛰어넘는 문화적 다양성’, 2부 ‘또 다른 세상과 마주한 사람들: 갈등과 위기를 넘어 이어온 힘’이라는 제목으로 서로 다른 두 가지 주제를 조명한다. 전시를 아우르는 주제는 ‘우리가 알던 인디언’이지만, 정작 전시를 관람하다보면 ‘인디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인디언’이라는 이름은 1492년 콜럼버스가 북미 대륙을 인도로 착각한 데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대신 전시에서는 앞서 언급해왔듯 ‘북미 원주민’이라고 칭한다.

둥그런 세상을 이루는 모든 존재들의 관계와 연결
1부는 북미 원주민에게 자연이 갖는 의미가 담긴 아기 요람으로 시작된다. 원주민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아이들이다. 자연은 이들의 가장 큰 선생님으로서, 갓난아기 때부터 자연을 탐구하며 주변 세계를 관찰하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어지는 전시품들에서는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웃도는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 주는 30여 부족의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삶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다. 그들에게 일상·예술·종교 사이의 벽은 존재하지 않았기에 일상용품이 곧 예술품인 동시에 가치관을 담은 상징적인 물건이기도 했다.
북미 원주민은 지역·부족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이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세상 속 모든 존재들의 ‘관계’와 ‘연결’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인간관계뿐 아니라 자연이나 초자연적 존재 사이의 관계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조화롭고 더불어 사는 삶을 강조했다.
북미 원주민들이 때와 장소에 무관하게 나누는 인사 ‘미타쿠예 오야신’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자연과의 교감과 조화·균형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물질적·정신적인 부분에서 모두 드러난다.

© 2024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 Licensed by Artists Rights Society (ARS), New York - SACK, Seoul
변화한 세상에도 전해지는 가치
2부는 유럽 사람들의 북미 대륙 정착 이후 달라진 원주민의 삶을 회화와 사진 작품 중심으로 조명한다. 여기서는 유럽인의 이주 이후 서로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로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었던 장소를 떠나야 하는 등 급격하게 변화한 원주민들의 삶을 다뤘다. 2부 전시는 이주민의 시선에서 본 북미 원주민의 모습, 미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원주민이 겪어야 했던 갈등과 위기의 순간, 북미 원주민 스스로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표현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민들은 그들이 경험치 못했던 외모와 복장, 생활 방식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진과 캔버스에 담았다. 이 시기의 사진과 그림들은 대체로 평화롭고 낭만적인데, 이는 해당 시기의 작품들이 서부로의 확장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려진 ‘프로파간다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드물게 사진작가 에드워드 커티스처럼 곧 사라질 문화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시기는 이미 원주민이 서구의 영향을 받은 이후였으므로, 이주민들이 생각했던 ‘때 묻지 않은’, ‘고고한’ 야만인의 이미지를 촬영하기 위해 사진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들이 원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을 만들어 지금까지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다.

전시장을 나설 때쯤이면 ‘우리가 알던 인디언’이 어느 순간 ‘북미 원주민’으로 변화하였음을 눈치챌 수 있을 것이다.
북미 원주민들은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불가피한 변화를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노력은 단순한 과거 재현의 차원을 넘어 있다. 과거의 유산을 통해 전통의 가치를 새롭게 재창조하고, 인류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원주민은 지나간 역사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현재를 살아가는 동시대인이다.
* 《쿨투라》 2024년 7월호(통권 121호) *